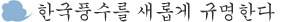|
대학을 떠난 최창조는 풍수 연구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과 좌절을 겪게 된다. 책에서 스스로 밝힌 바대로 자신의 처지는 그야말로 막막했다. 특히 풍수를 연구하는 공인 연구소가 하나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취직할 곳도 없었노라고 토로하였다. 결국 그의 선택은 정통 풍수와의 확실한 결별이었다. 몇몇 실학자들의 풍수적 견해를 들어 정통 풍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나선 그는 명당이란 본래 없는 것이며,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에 맞으면 그곳이 바로 명당이란 주장을 더욱 거세게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1992)』이다.
그가 정통 풍수를 잡술로 몰아붙일 수 있는 배경에는 도선과 실학자들의 풍수적 견해가 있었다. 도선의 풍수적 행태 중에서 그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절터만을 찾던 그는 절터마다 한결같이 풍수 이론에 비추어 보아 흉지임을 확인하고 놀란다(진짜로 그런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고는 '우리 풍수는 지형적 결함이 있어 사람이 살기 적당치 않은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바꾸어 보자는 지리 사상'임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인륜과 지리에 부합하는 진정한 풍수가라고 치켜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서두부터 2천년을 넘게 학문적으로 발전한 풍수를 동기감응론(조상을 길지에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사상)의 신비성을 들어 일격에 엉터리로 몰아붙인 그는 그 근거로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과 홍대용(洪大容)의 견해를 들고 나왔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자식 잘되라고 그 자식과 마주앉아 두 손 잡고 훈계해도 어긋나기가 쉬운데, 하물며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있는 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정약용)["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 p16]
중형을 당하여 옥에 갇힌 죄수가 옥에서 당하는 고초가 뼈를 깎는 것일 터인데도, 그 죄수의 아들이 아비가 받는 악형 때문에 몸에 악질이 들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늘, 하물며 죽은 자의 혼백에 있어서랴. 어찌 죽은 아비가 산 아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겠는가.(홍대용)["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 p16]
실학자들이 풍수를 비판한 배경에는 당시 그들이 처한 사회적 입장과 현실개혁 의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 모두 죄인과 야인의 입장에서 사회체제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서 기존의 틀을 바꿔보자는 진보적인 주장을 하였다. 그 중에서 풍수에 대한 견해는 풍수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대부에 대한 반감의 발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큰 공적도 없으면서 부귀영화에 빠진 권력자들이 지관을 들여 묘터를 잡는 꼴이 혁신적 사고를 가진 그들에게 곱게 보였을 리 만무한 것이다.
하지만 최창조는 곧 뒤집기를 시도하여 동기감응론을 만에 하나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어진 사람이나 효자들이 추구할 바가 못된다고 말했다. 이유는 '길한 장소는 발견하기 쉽지 않고, 진정 숙련된 풍수가를 만나기란 특히 어렵다.'라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글을 인용하였다. 정통 풍수를 잡술로 몰아붙인 그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항상 정통 풍수의 경전을 들먹이는지 모를 일이다.
풍수사가 얼마나 숙련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를 고용하는가 못하는가에 관계없이 어떤 장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효도로써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아득한 우주 속 저 멀리 있는 천(天)은 외로운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고도 우연히 찾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덕에 보답한다.["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 p17]
숙련된 풍수가를 만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자, 그는 자연스럽게 조선의 왕릉 입지와 수난의 역사를 대비시켰다. 최고의 지관이 동원되고 쓰고 싶은 땅을 마음대로 골라 쓰게 했는데도 임금의 자손들은 골육 상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세종의 능에 대한 일화도 첨가되었다. 세종는 본래 내곡동에 묻히었는데, 19년이 지나서 이장할 때도 물에 잠긴 시신은 삼베 옷 하나 썩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9년 동안 문종, 단종, 세조, 예종 등 네 명의 임금이 바뀌는 불운을 겪고, 다행히 여주의 영릉(英陵)을 길지에 잡아 이장하여 조선의 국운이 100년을 더 했다고 한다. 영릉은 물이 오른쪽에서 나와 혈을 감싸안고서 왼쪽인 진방(辰方)으로 빠지니, 수국(水局)이다. 이때 내룡은 임자룡(壬子龍)이니 포태법 상 장생룡(長生龍)에 해당하여 혈에 생기가 가득해서 안장 후에 대발할 터이다. 하지만 좌향을 남향으로 놓아 자연을 거슬렸는데, 이 경우는 30년이 지나면 양기에 의해 패절한다. 연산군이 그렇다.
또 남사고(南師古, 생몰년 미상)의 예를 들었다. 남사고는 『격암유록(格庵遺錄)』까지 지은 사람으로 풍수학에도 정통하였다. 풍수학을 배운 다음 아버지의 묘를 찾으니 흉지에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길지라 생각되는 곳에 유골을 옮겨 무덤을 다시 만들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겨 그 후도 아홉 번이나 더 옮겼다. 그러나 그 역시 만족할 만한 터가 아니었다. 그래서 길지를 찾아 전국을 답사한 끝에 천하의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이란 명당을 찾았다.
춤을 출 듯이 기뻐한 남사고는 그 즉시 아버지 무덤을 파내고는 유골을 수습하여 그 장소에 이장하였다. 그런데 이장을 끝내는데, 한 일꾼이 "구천 십장(九遷十葬)한 남사고야, 비룡상천만으로 여기지 마라. 고사괘수(枯蛇掛樹)가 이것 아니던가."라고 노래를 불렀다. "아홉 번 이장하여 열 번째로 장사지내는 남사고야, 용이 하늘로 오르는 명당이 아니라 죽은 뱀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형상이 바로 이곳이다."란 뜻이다. 깜짝 놀란 남사고가 다시 산세를 살펴보니 과연 죽은 땅이었다. 그러자 남사고는 유골을 다시 지고 내려와 흉하지 않은 곳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즉, 남사고보다 일꾼의 풍수 실력이 나으니 세상 어디에도 숙련된 풍수가는 없다는 역설적 주장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