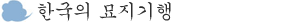|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에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대학자였던 최항 선생의 묘와 사당이 있다. 도마리에 이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은 팔당으로 가는 45번 국도요, 오른쪽은 양평으로 가는 308번 국도이다. 이 삼거리에서 308번 국도로 약 100m쯤 가면 오른쪽에 마을로 들어가는 시멘트 길이 있다. 차 두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이 길은 곧장 마을로 연결되었고, 사당은그 길의 끝에 은행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있는 곳에 있다. 사당 입구에는 풍우에 시달려 글씨가 지워진 화강암 비석이 있다. 돌담으로 에워 싸인 사당의 처마에는 ‘文靖公崔恒之廟’라는 현판이 빛이 바랜 채 걸려 있고, 사당 안에는 선생의 신위가 다소곳이 모셔져 있다. 선생의 묘는 마을 입구 왼쪽 동산에 있는데, 집모퉁이로 난 돌계단으로 오르면 된다.
외교 문서에 탁월하였던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 1409~1474)의 자(字)는 정보(貞父), 호는 태허정(太虛亭)․동량(㠉梁)이며, 본관은 삭녕(朔寧)이다. 영의정에 추증된 사유(士柔)의 아들로 태어나 당대의 문장가인 서거정(徐居正)의 자부(姉夫)가 되었다. 1434년 26세 때 알성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집현전 부수찬이 되어 박팽년․신숙주․성삼문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고, 세종 때에는 주로 편찬 사업에 관여하여 「용비어천가」․「동국정운」․「훈민정음해례」 등을 만들어 벼슬이 대사헌에 올랐다. 세조가 즉위하자 「경국대전」편찬에 관여하여 예종 원년에 왕에게 바쳤고, 1466년 판병조사에 임명되자 군사 관계는 적임이 아니라고 스스로 간절하게 사양하여 다른 관료들의 존경을 받았다. 1467년 영의정에 올랐고,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40년간 탄핵 받지 않은 태허정
태허정은 조선 초기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어학은 물론 문장에도 뛰어나 당시 명나라와의 외교 문서는 대부분이 그가 지은 것이라 전한다. 글만 좋아 할 뿐 집안 일에는 조금도 관여치 않는 전형적인 선비상으로, 오늘날 같은 염랭한 세태에 어떻게 처세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거의 40여 년간 벼슬을 하였으면서도 신중히 처세하여 한 번도 탄핵받거나 귀양 가지 않았고, 겸손하고 말이 적어 타인과 의견 충돌이 없었으며, 또한 재산을 탐하지 않아 시비가 없었다니, 얼마나 올곧은 삶을 산 것인가. 특히 계유정난(癸酉靖難)때는 세조를 도와 정난공신(靖難功臣)에 녹훈되어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세조가 즉위할 때는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정해년에 정승이 되고 반년만에 다시 우의정․좌의정․영의정에 오르니 복이 너무 지나치다 하여 벼슬을 사직하기까지 하였다.
돌하르방을 닮은 문신석
풀 숲에 가려진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면 도마리의 넓은 들판과 삼거리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묘가 있다. 묘는 근래에 정비하였는지 돌로 기단을 쌓아 흙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묘 앞에는 문신석이 두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입을 꼭 다문 채 서 있다. 두 손은 가지런히 배 부분에 모아 붙인 이 문인석은 흡사 제주도 장승인 ‘돌하르방’과 비슷하다. 위엄은 있으되 마음씨 너그러운 할아버지를 본 딴 돌하르방이 당시 제주도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제주도 것은 1754년에 처음 세웠다 한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제주도 돌하르방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묘에서도 보기 힘든 이 문신석 중 한쪽 것은 어깨가 치켜 올려져 있어서 현무암으로 만들었다면 더욱 그 모습이 같았을 것이다. 다만 머리에 유관을 쓴 모양이 둥근 감투를 쓴 제주도 하르방과 구별될 뿐이다. 너그럽고 관대하여 누구와도 다툼이 없었던 선생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인석 앞에는 근래에 세운 상석과 예전에 세운 묘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輸忠衛社協贊靖難佐翼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春秋館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 寧城府院君 贈 諡文靖公崔恒之墓’ 라고 쓰여 있다.
1453년 동부승지로 있을 때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계유정난(癸酉靖難)에 협찬한 공이 있다 하여 정난공신 1등에 녹훈되어 도승지가 되고, 이어 1455년 세조가 즉위하면서 좌익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1471년(성종 2)에 그동안 「경국대전」․「무정보감」 등을 찬한 공이 인정되어 좌리공신 1등에 녹훈된 사실이 묘비에 적혀 있다. 묘는 호석이 없이 봉분만 있어 일반 백성들의 묘처럼 소탈하니, 평생 재물을 탐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다 가신 선생의 유지를 그 후손이 받든 것으로 보인다. 묘 주위는 어찌나 많은 ‘원추리꽃’이 피었는지 꺾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뭇 선비들이 저승에 계신 선생이 혹시나 근심에 차 있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보낸 꽃이니 어찌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으랴. 망우초(忘優草)에 코를 대고 그 향기를 음미하며 천천히 산을 내려 왔다.
장원백(壯元栢)
태허정에 대한 일화는 여러 문헌에 골고루 전하는데, 모두가 뛰어난 문장과 겸손하고 단정하여 평탄한 벼슬살이를 한 일을 극구 칭찬하는 글이다. 「어우야담(於于野譚)」에는 세조가 장차 과거를 보이려 할 때 하루는 용 한 마리가 성균관 서편 잣나무에 서리어 있는 꿈을 꾸었다. 꿈을 깬 후 곧내관을 시켜 가 보게 하였더니, 한 선비가 행탁(여행할 때 행장을 넣는 자루)을 베고 잠을 자는데, 발을 잣나무에 걸고 있었다. 이 과거에서 태허정은 장원으로 급제를 하였는데, 내관이 보니 잣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던 바로 그 선비였다. 그로부터 이 잣나무를 장원백(壯元栢)이라 불렀다 한다. 그 후 태허정은 몇 해 되지 않아 집현전 직제학이 되고 이어 부제학에 승진하였으며, 18년 동안 강설(講說)․사명(詞命)․편찬 및 저술에 힘써 세종으로 하여금 ‘큰 솜씨’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태허정은 외국이나 국내의 중요 문서를 짖는 변려문(騈儷文) 문체에 밝아 명(明)나라에 보내는 모든 표(表)와 전(箋)은 거의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문장이 웅장하고 호방하여 중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표전(表箋)의 내용이 정절(精切)하다고 칭찬하였다 한다.
세조 때에 이르러 태허정의 문장과 학식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 「경국대전」 편찬 중 세조가 기복출사(起復出仕:부모의 상중에 벼슬에 나아감)을 명하자, 세 차례나 거절하였다. 이에 세조가 말하기를,“경의 재능은 나 홀로 아는 바 아니니 오로지 일신만을 위할 수 없다.” 하므로 부득이 명에 응하였고, 세조가 경서(經書)에 토를 달 때 태허정이 옆에서 자문을 하였다. 태허정의 분석, 해설하는 대답이 마치 메아리 소리와 같자 세조가 좌우에게 이르기를, “영성(寧城)은 참 천재다.” 라고 칭찬하였다 한다. 태허정의 온후하고 관대한 성품에 대하여 「필원잡기」에는, “선생은 성품이 겸손하고 간정하여 겉을 꾸미지 않았으며, 평탄하게 처세하여 남보다 다르려고 하지도 않았다” 라 하였고, 「명신록」에는, “두 차례나 정승이 되어 정사에 관대하기를 힘쓰고, 제도 개혁을 좋아하 지 않았으며, 대사를 결정할 때는 확고하여 범하지 못하였다. 조정에 들어 선 지 40년 동안 한 번도 탄핵을 당한 적이 없었으며, 벼슬이 정승에 오르기까지 하루도 외관직을 살지 않았다.” 하였다. 「시화총림」에는, “선생은 보통 지낼 때 비록 추위가 심하거나 몹시 더운 날이라도 하루 내내 의관을 정제하고 조금도 게으른 용태가 없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태허정이 지은 시는 대개 옛 사람의 법식을 답습하지 않고 독창적인 솜씨로 지어 호걸스러울 뿐 아니라, 정밀하고 적절하게 고사(古事)를 쓴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예로 선생이 지은 ‘검은 콩〔黑豆〕’이란 글을 보면, “흰 눈〔白眼〕은 손(客)을 미워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 같고, 검은 몸은 원수를 갚을 마음이 있는 듯하다” 라고 하여 흰 콩은 손님을 냉대하는 뜻으로, 검은 콩은 문인(文人)과 열사(烈士)로 비유하였다. 중국 진(晋)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분으로 완적(阮籍)이 있었는데, 그는 눈을 푸르게도 희게도 할 수 있었다. 속세에 얽인 속인이 오면 그는 늘 눈을 희게하여 냉정히 대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국시대 지백(智伯)의 부하 예양(豫讓)은 지백의 원수를 갚고자 몸에 옻칠을 하여 나병 환자로 가장하고, 조양자(趙襄子)를 죽이려고 피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조양자가 불쌍히 여기어 살려 주자, 이번에는 숯불을 머금어 벙어리가 되어 다시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결국 조양자의 옷을 달라고 하여 그 옷을 칼로 내리치고 자결한 고사에서 검은 콩을 열사로 비유한 것이다. 태허정의 문장을 가르켜 권지재(權止齋)는 탄복하며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문자는 기습(氣習)이 쇠약하고 기력이 없는데, 능히 발양 (發揚)하고 떨쳐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다.” 하였다. 산 아래에는 태허정에게 제사를 지내는 영모재(永慕齋)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 태허정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듣고 돌아 오는 길에 선생이 해운대를 찾아가 감회를 적은 시를 읊어 보았다.
구태어 대(해운대)에 올라 찬바람 쏘일 것 없네 (登臨不必御冷風)
봄 꽃은 이미 저버렸나니 (拂盡東華舊軟紅)
취한 채 금오산을 밟으며 쉼 없이 시 읊는데 (醉踏金鼇吟未己)
신선의 퉁소 소리 바다 구름에 퍼지네 (紫簫聲徹海雲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