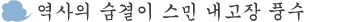황희 정승
[반구정]
백구(白鷗)야 껑쩡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성상(聖上)이 버리시매 너를 좇아 예 있노라
이 노래는 우리 나라의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단가의 한 귀절이다. '껑쩡'이라는 말에는 익살끼까지 있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옛날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던 사람이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생생하게 나타내었고, 자연을 그리는 마음 중에는 물가에 자유롭게 날아 다니는 흰 갈매기 떼가 가장 신비롭게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생긴 것이요, 자연에의 동경이 뭉쳐 이루어진 것이 반구정이다. 똑같이 갈매기를 벗삼아 놀겠다는 의사가 담기어 있어도 서울의 압구정(狎鷗亭)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서울의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근처에 있던 압구정은 당시 부귀와 권세를 한 몸에 지니고 현직에 있으면서 흥청거리는 마음을 호사롭게 나타내기 위하여 지은 정자이다. 압구정이란 그 '狎'자도 정말 흰 갈매기와 동무 삼아 놀겠다는 뜻이 아니라 갈매기를 길들이어 손아귀에 넣고 가지고 놀겠다는 의도가 암암리에 숨겨져 있다. 반구정의 '伴'자와 같이 진정으로 갈매기와 친한 벗이 되겠다는 취지와는 신선한 맛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반구정이 있는 문산읍 사목리로 방촌이 만년에 갈매기를 벗 삼아 보내던 곳이고, 반구정(伴鷗亭)은 임진강 가의 기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아래로는 임진강의 푸른 물이 굽이쳐 흐르고, 곁에는 송림이 울창하여 예부터 갈매기가 많이 모여 들었다 한다. 편액(扁額)이 처마 밑에 걸려 있는데, 이름하여 '伴鷗亭', 곧 '갈매기와 짝하는 정자'라는 뜻이다. 정자 이름도 멋지거니와 글씨 또한 멋이 넘치는 명필이다.
황희는 86세에 벼슬에서 물러난 뒤 이 곳에다 정자를 세워 낙하정(洛河亭)이라 이름하고, 강물 위에 날아다니는 흰 갈매기를 벗 삼고 시를 읊으면서 여생을 보냈다 하며, 사후에 없어진 것을 4백년이 지난 뒤에 후손이 다시 세우고 그 뜻을 따서 '반구정'이라 이름 짓고 중수, 보존하여 오다가, 6.25사변 때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을 1967년 6월 사방 4간 규모로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한다. 이곳의 밑에는 파란 임진강이 굽이쳐 유유히 흐르는데, 날씨가 좋으면 강 건너 북쪽으로 멀리 개성의 송악산이 눈 앞에 다가선다고 한다.
[앙지대]
반구정에서 남쪽으로 바로 이어진 등성이 위쪽에는 또 하나의 정자가 멋드러지게 서 있는데, 그 곳까지 층계가 나 있다. 정자의 크기는 반구정보다 작고 6각형인데, 이름하여 앙지대(仰止臺)이다. 이 정자는 1455년(세조 원년)에 유림들이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여 영당(影堂)을 짓고 영정을 봉안할 때 함께 지은 것이라 한다. 앙지(仰止)는 앙지(仰之)로도 쓰는데, 시경(詩經) 소아(小雅)에서
높은 산을 우러러 받들듯이 (高山仰止)
넓게 트인 길 우리 따르리 (景行行止)
따 지은 것으로, 후생들도 이 어른의 높고 맑은 뜻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자 내부에는 1973년 3월에 이은상이 쓴 중건기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후손이 쓴 현판시가 하나 걸려 있다. 정자는 단청도 화려하고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곳이 5백여 년 전에 방촌이 소일하던 곳이라 생각하니 더욱 감회가 깊었다. 더욱이 눈 아래에 흐르는 임진강을 바라보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이라 훌쩍 떠나기가 아쉬웠다. 널찍한 마당에는 잘 정돈된 고택(古宅)과 방촌의 동상이 있고, 뒤쪽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29호인 영당이 있다.
[황희 전승]
황희(黃喜, 1363∼1452) 정승은 고려 공민왕 12년에 태어나 조선 문종 2년에 세상을 떠난 이름난 정치가이다. 본관은 장수(長水)이고,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4대 임금을 도와 많은 업적을 남기었는데, 특히 세종의 지우(知遇)을 입어 빛나는 업적을 남기었으며 청백리(淸白吏)로도 유명하다. 개경에서 출생한 방촌은 어릴 적 이름이 수로(壽老)이었다. 14세에 음관(蔭官)으로 복안궁 녹사(福安宮錄事)가 되고, 21세에 사마시에 합격,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에 성균관 학관이 되었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고려에 대한 충절로 충신들과 함께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이 곳에서 방촌은 평생 벼슬과는 인연을 끊고 학문에만 전념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방촌의 지모에 반한 조선 태조의 끈질긴 간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벼슬 길에 나서게 되었다. 조선조에 발을 들여 놓은 방촌은 태종 때 왕의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6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그러나 태종이 장자인 양녕대군을 제치고 지차인 충령대군(후에 세종)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후세에 큰 환란의 씨가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였고, 급기야는 1413년(태종 16) 세자 폐립 문제로 왕의 노여움을 사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성군인 세종은 즉위 4년에 태종의 부탁을 받고 좌참판에 발탁하였다. 큰 인물이 큰 인물을 만나 평생을 두고 공적으로는 군신의 관계로, 사적으로는 벗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종의 업적에 큰 힘을 보태었다. 공은 좌·우의정을 거쳐 18년 동안 영의정에 재직하면서 부국 강병에 꾸준히 힘쓰다가 세종 31년(1449) 86세로 벼슬길에서 물러나 이 곳 파주의 임진강 가에 반구정(伴鷗亭)을 짓고 강물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를 벗 삼아 시를 읊으며 남은 생을 보냈다. 돌아가신 후 익성(翼城)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세종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재미있는 일화]
하루는 방촌이 퇴궐하여 집에 오니 하녀 두 명이 서로 매우 다투고 있었다. 방촌이 온 것을 알고도 그녀들은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그 중 한 하녀가 방촌에게 달려와 사건 전말을 이야기하며 시비곡절을 가려 주기를 청하니, “네 말이 맞다.” 하였다. 이에 성이 난 다른 하녀가 항의를 하며 자초지종을 말하니, “그래 네 말도 맞다.” 하였다. 그 때 부인이 그 곁에 있다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하니 도대체 어느쪽 말이 맞는 것이냐고 따지자 “그래 부인의 말도 맞소(夫人之言是也).” 하였다 한다. 이 일화는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고 집안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성품과 하찮은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대인의 풍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방촌이 얼마나 청백리였는지는 다음의 일화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방촌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아들인 황치신(黃致身)이 정승의 자리에 올라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고자 선물을 사 가지고 이 곳에 오게 되었다. 그 선물은 물론 녹봉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으나, 방촌은 대노(大怒)하며 말하기를, "네놈이 벌써 재물을 아느냐." 하며 즉시 임금께 상소하여 아들을 파직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방촌이 하루는 시골 길을 가는데 한 농부가 밭에서 소 두 마리를 쟁기에 메워 밭을 갈고 있었다. 가만히 지켜 보니 한 마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마리는 꾀를 부렸다. 이에 큰 소리로, "거 농부님 어떤 소가 일을 잘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방촌에게로 다가와서 귀를 빌리더니, "이쪽 소는 잘 하는데, 저쪽 소는 잘 못합니다."하였다. 그러자 방촌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조심스레 말을 하느냐고 묻자 농부는, "아무리 미물이라도 자기가 잘못한다고 말하면 좋겠읍니까." 하였다. 이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후로는 더욱 말을 조심하고 남을 탓하지 않았다 한다.
[황희의 묘]
묘로 오르는 길은 후손이 사는 집의 담 옆으로 난 돌로 된 30여 계단을 올라가면 된다. 돌계단과 상석은 근래에 마련하였고, 묘는 명재상에 어울리게 큼직하게 만들어졌다. 묘 앞으로는 저 멀리 올망졸망한 낮은 산들이 앞에 둘리어 있어서 구름 속에 있는 듯하다. 잔디가 곱게 자란 앞쪽에는 근래에 돌을 쌓아 넓고 평평하게 만들었고, 그 밑에는 많은 향나무가 심기어 있다. 근래에 설치하여 이끼 하나 없는 상석은 큼직한데, 원래의 상석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조그만 것이 묘 왼쪽 한 곳에 버려져 있다.
상석 앞에는 장명등이 고태스런 모습으로 의젓하게 서 있고, 양쪽에는 문신석이 다소곳이 있다. 묘비는 오래되어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이 알아 볼 수 있다. 묘비에는 '領議政翼城公 村黃喜之墓. 繼配貞敬夫人 淸州楊氏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묘는 흔히 볼 수 있는 묘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능묘의 봉분 주위를 둘러 쌓은 돌을 호석(護石)이라 하는데, 이 묘는 호석을 앞쪽에만 쓴 것이 특이하다. 앞쪽에만 돌로 2단으로 쌓고, 그 양쪽에서 다시 2단으로 돌을 길게 앞쪽으로 쌓아 마치 짐을 가득 실은 마차를 연상케 한다.
전하는 말에, 조선시대의 정승은 넷 밖에 없다 한다. 이 말은 이 분들의 이름 아래에는 대체로 '정승'이란 말을 붙이기 때문이다. 황희 정승을 비롯하여 맹정승 맹사성(孟思誠, 1359∼1438), 상정승 상진(尙震, 1493∼1564) 오리(梧里) 정승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을 가리키는데, 특히 방촌은 향년 89세에 별세한 장수한 정승으로, 그 뛰어난 학문과 치정(治政)보다는 그 휼륭한 인덕(仁德)으로 인한 처세와 삶의 지혜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사진 : 반구정 전경]
|